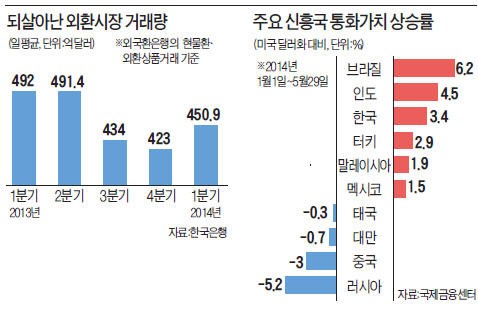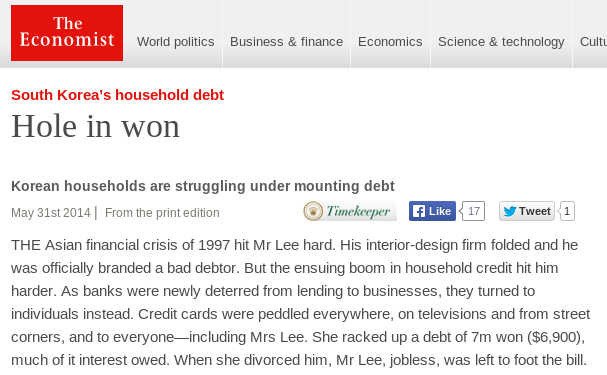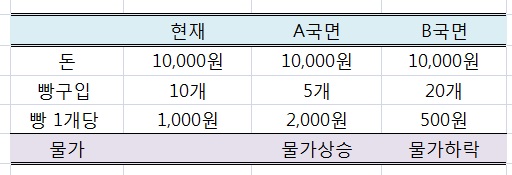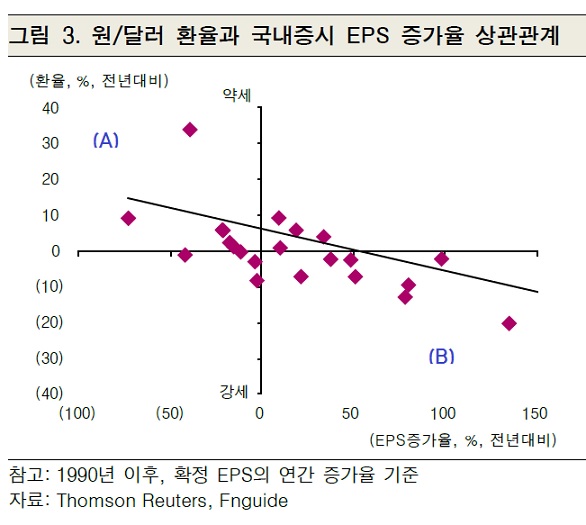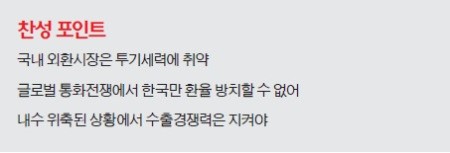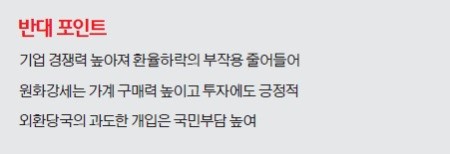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
-늘어나는 가계 부채, 경제 성장 저지할 위협
-한국 연금기금 규모 작고 사회복지 혜택 불충분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economist)가 31일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급한 상황을 심층 분석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 가계저축률이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고, 이는 OECD중 최하치인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지만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채의 절반 이상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이것이 매달 갚아 나가야하는 지불금으로 인해 수입보다 더 지출이 더 높은 구도를 중산층 가계에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OECD에 속한 부유한 국가들이 빚을 줄여온 것에 대비해 심각한 상황임을 말했다.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은 개인의 빚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 큰 부분인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를 없애주어 개개인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급성 부채뿐 아니라 만성부채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결론을 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이다. 번역 감수: 임옥
South Korea’s household debt 한국의 가계부채 Hole in won 홀-인-원 (\): 구멍난 한국 경제 Korean households are struggling under mounting debt 한국 가정들 쌓여가는 빚더미에 허덕이다 May 31st 2014 | From the print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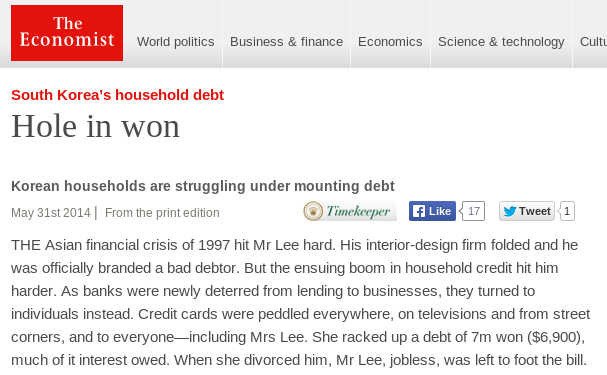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hit Mr Lee hard. His interior-design firm folded and he was officially branded a bad debtor. But the ensuing boom in household credit hit him harder. As banks were newly deterred from lending to businesses, they turned to individuals instead. Credit cards were peddled everywhere, on televisions and from street corners, and to everyone—including Mrs Lee. She racked up a debt of 7m won ($6,900), much of it interest owed. When she divorced him, Mr Lee, jobless, was left to foot the bill.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이 씨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접었고 공식적으로 불량채무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 급등한 신용카드 부채는 그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사업체에 대한 대출이 힘들어지자 은행들은 대신 개개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신용카드가 모든 곳, 텔레비전에서, 길 모퉁이에서, 이 씨 아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됐다. 이 씨의 아내는 7백만원 (6천 9백 달러)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중 많은 액수가 이자였다. 아내와 이혼했을 때 직장도 없는 이 씨에게는 지불할 고지서만 남겨졌다. South Korea’s economic growth-spurt was built on the massive debt of its chaebol, huge industrial conglomerates. Now mounting household debt threatens to stunt it. It exceeded 1 quadrillion (1,000 tr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And it is rising much faster than both the country’s GDP and its average household income: in 2012 household debt was 1.6 times that of Koreans’ annual disposable income, compared with an average of 1.3 for the OECD, a group of rich countries. Whereas affluent consumers globally have shed debt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South Korea’s pile has steadily grown. 한국의 급속 경제 성장은 거대 산업체인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하여 이뤄졌다. 현재 쌓여만 가는 가계 부채는 경제성장을 저지할 위협이 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국가전체의 GDP와 평균 가구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에 가계 부채는 한국인의 연간 가처분 소득의 1.6배였던 것에 비해 부유한 국가들의 그룹인 OECD는 평균 1.3배였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소비자들이 빚을 줄인 한편, 한국의 빚더미는 꾸준히 늘었다. Part of the reason is that the crisis merely ruffled South Korea, so subsequent belt-tightening was limited. Piecemeal restrictions put on banks, including lower debt-to-income limits for their clients, opened the door for energetic competition from non-bank rivals. Loans from credit-card companies, mutual savings groups and insurers are growing faster than lending by big banks. In 2013 they accounted for 540 trillion won, over half of total household debt—a record high. 이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금융위기가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동만 일으키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객들의 수입대비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은행들에 가해진 제재는 비은행 경쟁자에 의한 활발한 경쟁을 가능케 했다. 신용 카드회사들과 상호신용금고그룹들 그리고 보험회사들로부터의 대출이 대형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대출이 총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인 540조원에 이르러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Regulators have cottoned on, and are trying to curb frothy lending by non-banks. In 2012 co-operatives were made to lower their loan-to-deposit ratios to 80% (banks’ ratios hover around 97%). Insurers were restricted from excessive advertising for household-loan products. The maximum interest rate non-banks can charge has been cut from 39% annually to 35%. That may be encouraging a black market for loans to the least creditworthy. 규제자들이 이 점을 알아차리고 비 은행들에 의해 거품처럼 부푸는 대출을 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2012년에 협동조합들은 저축대 대출비율을 80%까지 낮추도록 규제됐다 (은행은 97% 주위를 맴돈다). 보험회사들은 가계대출 상품을 위한 과도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비 은행들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이자는 연리 39%에서 35%로 인하됐다. 그것이 신용이 최저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암시장을 장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 Now a new debt-relief programme aims to bring these low-credit, low-income households back into the banking fold. The state-run National Happiness Fund (NHF), set up in March 2013, waived Mr Lee’s hefty interest and half of his debt’s principal. He is now paying back the other half, at a low rate, over the next decade. His diligence thus far has allowed him to open his first bank account in 17 years. 이제 새로운 채무구제 프로그램은 이들 저신용, 저소득 가구들을 금융권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3년 3월 설립된 국영 국민행복기금은 이 씨의 상당한 이자 및 부채 원금의 절반 가량을 탕감해주었다. 이 씨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낮은 이율로 나머지 절반 금액을 갚아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근면성실함이 17년 후에 그가 첫 번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The fund, worth up to 18 trillion won, has helped 249,000 others waive half of their debts in the year since it was set up. It buys loans worth less than 100m won that are more than six months in arrear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nd writes off up to 70% of the principal. Another 48,000 debtors received “Dream Loans”, which switch high interest rates to lower ones. The most conscientious can borrow up to 10m won at rates which banks would offer only to the more creditworthy. 18조원을 육박하는 기금은 설립된 이후 한 해 동안 다른 24만 9천명의 사람들에게도 부채의 절반을 면제하는 도움을 주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6개월 이상 체납된 1억원 이하의 대출금들을 구입해서 원금의 70퍼센트까지 탕감한다. 또 다른 4만 8천명의 채무자들은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꾸어주는 “드림론”을 받았다. 가장 성실한 사람들은 은행 측이 신용도가 더 높은 이들에게만 제시하는 이율로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The NHF has focused o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oor. Yet the well-off still hold most of the country’s debt. Their main obstacle to credit is a restriction on mortgage loans, which cannot surpass half of a property’s value in South Korea. Even so, housing loans make up half of middle-income household debt. More homeowners are resorting to freer credit from non-banks, or using them as a stopgap when interest rates fluctuate (almost all home loans are variable). This has drained money that would once have been squirrelled away for a rainy day, or retirement. South Korea’s household savings rate has plunged from 19% in 1988 to 4% in 2012,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Yet Korea’s pension funds are small and social-welfare benefits limited. 국민 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한국의 부채 대부분은 여전히 부자들이 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된 신용 걸림돌은 한국에서 부동산 가치의 반을 넘을 수 없는 모기지 대출 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이 중산층 소득 가구 부채의 절반을 차지한다. 더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비은행권의 무조건 신용대출에 기대거나, 이율이 변동할 때 이들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이율이다.) 이것은 언젠가 어려울 때, 혹은 퇴직시를 대비해 저장해 둘 수 있었던 자금을 소비해버리도록 했다. 한국 가계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으며, 이는 OECD중 최하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연금기금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혜택들은 충분치 않다. Loan repayments gobble up a quarter of a middle class family’s income. Including mortgages, over half of these households could be considered in deficit, paying out more in expenses than they pay in, up from 15% in 1990, according to the McKinsey Global Institute. As house prices sag in the capital, Koreans’ personal finances are coming under strain. The government is now explicitly seeking to reduce household debt. For that it will need to tackle not only acute debt, but the chronic sort too. 대출상환금은 중산층 가정 수입의 4분의 1을 잡아먹어 버린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가계들의 반 이상이, 모기지를 포함해서 1990년에 15%이상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적자상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침체되면, 한국의 사금융은 압박을 받는다. 정부는 이제 가계빚을 줄이려 분명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성 채무뿐만 아니라 만성 채무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